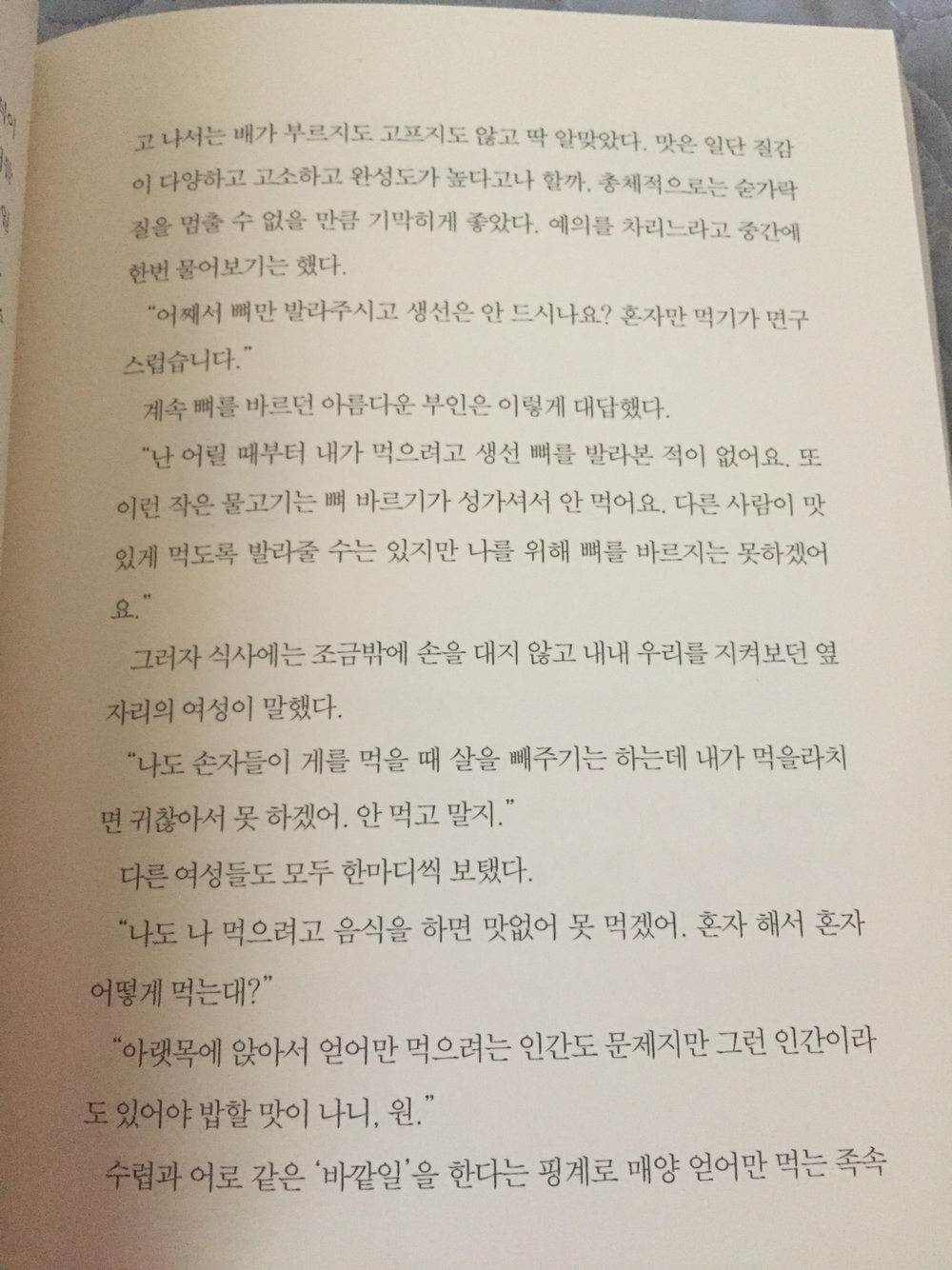<꾸들꾸들 물고기 씨, 어딜 가시나> 성석제 여행기?
일단 사진 한 장.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데 작가가 추천한 곳이다. Torres del Paine. 토레스델파이네 국립공원. 칠레 파타고니아에 있단다. 죽기 전에 꼭 한 군데 다시 가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디냐는 질문에 작가가 꼽은 곳. 궁금해서 검색했더니.. 이런 곳이다. 우...와....
서울에서 거기까지 빨라도 사흘 걸리는 곳. 작가의 설명은 사실 이렇다.
거기가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은 풍경을 보여줘서예요. 나는 지옥이나 천국이 있다고 믿지 않지만 그게 인간의 상상에서 나왔다는 건 알아요. 토레스델파이네 계곡 아래에 핑크와 옥색이 빙산이 떠 있는 호수가 있어요. 거기로, 불교에서 말하는 풍도지옥처럼 살을 에는 듯한 거센 바람이 불어와요..그 삭막함, 천애의 무덤 같고 세상의 끝처럼 아무런 꾸밈없고 가차 없고 무정한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세상 안에 살명서 인생의 절반은 세상 바깥을 꿈꾸는 아이러니가 삶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해주고."
알고 보니, 책은 여행기였다. 처음에는 정말 아닌 줄 알았다. 일단 제목은 이해불가. 그러나 성석제 아닌가. 그냥 믿고 가는 수 밖에. 그리고 눈밝은 Y가 선물해준 책이다. 두 번 믿고 갔다.
사실 새해 첫 책 <싸울 기회>는 잼났지만 550쪽에 육박했고, 두번째 책 <빅숏> 400쪽을 간신히 끝냈는데 오늘 K가 안겨준 책 <혐오와 수치심>은 700쪽ㅠ 짧은 소설이나 에세이로 기분 전환부터 해야겠다....고 그그저께 밤, 결심하고 고른 책이다ㅎㅎ
첫 에피소드가 예사롭지 않았다.
매년 3월 기형도의 묘지를 찾아 스물다섯번 다녀왔다는 성석제쌤. 그날 결혼한 걸로 치면 은혼식이라고. 청년 시절 에피소드 기막히다. 두번째 얘기엔 출근길 지하철에서 혼자 빵ㅋ
기형도와 성석제, 두 청년이 박두진을 찾아가는 대목이다... 정말 기막힌 에피소드. 그리고 두번째 에피소드는 이 책을 관통하는 소재 중 하나인 화장실 이야기.. 작가는 여성에 대한 끝없는 관심과 염탐, 음식에 대한 애정, 화장실 에피소드를 끊임 없이 변주한다.
그러다가 이런 대목.
수렵과 어로 같은 '바깥일' 한다는 핑계로 매양 얻어만 먹는 족속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숭고한 여성들의 헌신성이 대대로 유전되고 있기 때문이리라.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난 정말 깊이 빡쳤다. 아들 위해 생선 가시 발라주다가 "마마보이를 키우려 하느냐"고 딸에게 혼난 기억 때문은 아니다. 여성의 헌신성에 대한 칭송은 대체로 절대 좋아할 수가 없다.. 근데 읽다보면, 이 분이 상주 촌구석에서 누에 치며 자란 이야기며, 그냥 그 시절 남자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인가 싶기도 하고.
날씨가 조금만 더워도 짜증나서 못쓰고 조금만 추우면 마음이 시려서 못쓴다. 날씨가 좋으면 이런 날 놀지 않고 써서 뭘 하나 싶어서 못쓴다. 바람 불어 좋은 날에 연인이라도 있으면 싱숭생숭해서 못쓴다. 결국 아무 때도 못 쓴다, 마감이 없으면
이런 대목에선.. 아, 그렇지. 작가란 저런 족속이지. 웃으면서 또 맘이 풀어지고.
한 시간 몇 km, 하루 얼마 주파하느냐로 속도전을 벌이던 우리..기록 세운다고 상받는것도 아니고 목표 달성해 어디 쓸것도 아닌데
사대강 자전거길 생기고 모두 서울-부산 1박2일 주파에 난리라고. 그 와중의 깨달음. 삶의 속도에 대한 이야기에 잠시 또 마음에 바람이 불고.
(오래가지 않을거라며) 양철과 패널로 대충 지은듯한 판문점..애저녁에 삭아서 끊어졌을. 하지만 인간이 만든 관계, 설정한 선은 얼마나 질긴가. 사랑과 청춘은..뼛가루가 흙먼지가 되었을터지만 증오와 불신, 핏물로 적은 기록은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
비무장지대 대성동에는 100m 높이 게양대의 태극기. 2km 떨어진 북한 기정동엔 160m 인공기. 실상 세계최초 세계최고 세계최대 세계유일 같은 형용어는 비무장지대 어디에서나 쉽게 볼수있다. 분단의 현장이라는 것부터 이제 세계 유일로 남았다
여행의 발걸음은 정처 없이 가게 마련이고. 판문점과 비무장지대도 객의 눈으로 바라본다. 저 지구의 땅끝마을 파타고니아도 갔다 오고, 동남아도 다녀오고. 중앙아시아, 터키, 그리스 이야기 등. 사실 작가로 살아간다는 것에 무진장 부러움이 밀려오는 글들이다. 작가도 의식한 듯, 마지막에 돌팔매를 가정하여 '죽기 전에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곳'을 얘기하고. 여행 다큐라든지, 일로 다녀온 여행들이라 설명하는데. 이러나 저러나 부러운 이야기.
키르기스스탄의 이식쿨 호수는 예전엔 바다였단다. 그래서 조금 짠 호수다. 거기서 나는 송어에 대한 설명이다.
대충 꾸들꾸들하게 마르면 찢어서 먹는데 담백하고 짭조름하고 질겨서 현지에서 파는 러시아 맥주 발티카9과 함께할 안주로 제격이었다. 그 '꾸들꾸들 물고기씨'한테서는 북어와 꽁치의 맛이 함께 나서 '북치'라는 이름을 하사했다..(162쪽)
꾸들꾸들 물고기씨, 어딜 가시나...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던지며 떠드는 성석제님. 어떤 에피소드는 혼자서 낄낄 댔고, 어떤 에피소드는 그냥 저냥 별 감흥 없이 넘어가고. 글 묶음이라 균질하지도, 맥락이 다 통하지도 않는다만. 뭐 어떠랴. 가볍게 마무리.
어떤 외국인이 라오스 사람에게 말했다.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 많이 벌라고"
"돈을 벌면 뭘 하지?"
"나처럼 여행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재미있게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거? 난 지금도 하고 있는데?"